정치는 어려워
대한민국은 ‘내전’ 상태가 아니다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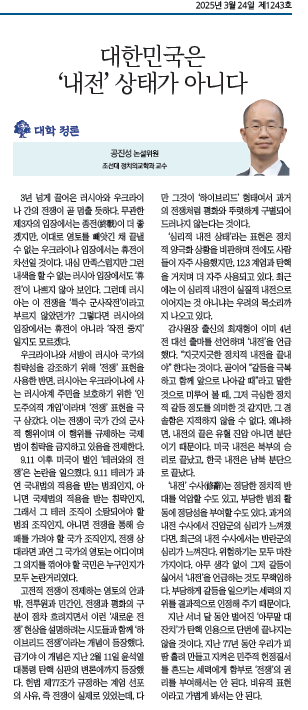
3년 넘게 끌어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곧 멈출 듯하다. 무관한 제3자의 입장에서는 종전(終戰)이 더 좋겠지만, 이대로 영토를 빼앗긴 채 끝낼 수 없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휴전이 차선일 것이다. 내심 만족스럽지만 그런 내색을 할 수 없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휴전’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 전쟁을 ‘특수군사작전’이라고 부르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휴전이 아니라 ‘작전 중지’일지도 모르겠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러시아 국가의 침략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쟁’ 표현을 사용한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사는 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며 ‘전쟁’ 표현을 극구 삼갔다. 이는 전쟁이 국가간의 군사적 행위이며 이 행위를 규제하는 국제법이 침략을 금지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9.11 이후 미국이 벌인 ‘테러와의 전쟁’은 논란을 일으켰다. 9.11 테러가 과연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인지, 아니면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침략인지, 그래서 그 테러 조직이 소탕되어야 할 범죄 조직인지, 아니면 전쟁을 통해 승패를 가려야 할 국가 조직인지, 전쟁 상대라면 과연 그 국가의 영토는 어디이며 그 의지를 꺾어야 할 국민은 누구인지가 모두 논란거리였다.
고전적 전쟁이 전제하는 영토의 안과 밖, 전투원과 민간인, 전쟁과 평화의 구분이 점차 흐려지면서 이런 ‘새로운 전쟁’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들과 함께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급기야 이 개념은 지난 2월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에까지 등장했다. 헌법 제77조가 규정하는 계엄 선포의 사유, 즉 전쟁이 실제로 있었는데, 다만 그것이 ‘하이브리드’ 형태여서 과거의 전쟁처럼 평화와 뚜렷하게 구별되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표현은 정치적 양극화 상황을 비판하며 전에도 사람들이 자주 사용했지만, 12.3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 심리적 내전이 실질적 내전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감사원장 출신의 최재형이 이미 4년 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내전’을 언급했다. “지긋지긋한 정치적 내전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곧이어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라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저 극심한 정치적 갈등 정도를 의미한 것 같지만, 그 경솔함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내전의 끝은 유혈 진압 아니면 분단이기 때문이다. 미국 내전은 북부의 승리로 끝났고, 한국 내전은 남북 분단으로 끝났다.
‘내전’ 수사(修辭)는 정당한 정치적 반대를 억압할 수도 있고, 부당한 범죄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 과거의 내전 수사에서 진압군의 심리가 느껴졌다면, 최근의 내전 수사에서는 반란군의 심리가 느껴진다. 위험하기는 모두 마찬가지이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갈등이 싫어서 ‘내전’을 언급하는 것도 무책임하다. 부당하게 갈등을 일으키는 세력의 지위를 결과적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지난 서너 달 동안 벌어진 ‘아무말 대잔치’가 탄핵 인용으로 단번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77년 동안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들고 지켜온 민주적 헌정질서를 흔드는 세력에게 함부로 ‘전쟁’의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비유적 표현이라고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 이 글은 2025년 3월 24일자 <교수신문>에 실린 것입니다.




